침묵의 살인자, 복부 대동맥류
상대성 이론으로 잘 알려진 아인슈타인은 폭탄 폭발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외부의 화학 폭탄이 아닌, 몸속에 숨어 조용히 자라던 ‘체내 시한폭탄’이 터진 것이다. 영어로는 AAA (Abdominal Aortic Aneurysm), 우리말로는 ‘복부 대동맥류’라 불리는 질환이었다.
복부 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의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발생한다. 복부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복부의 주요 장기와 하반신으로 전달하는 중심 혈관이다. 이 혈관의 벽이 약해지면, 심장에서 밀려오는 강한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풍선처럼 점차 부풀어 오른다. 정상 혈관 직경의 1.5배 이상 커지면 복부 대동맥류로 진단하며, 3cm 이상이면 초기 단계로 본다. 이 질환은 공기를 넣으면 부풀다가 한계를 넘으면 ‘펑’ 하고 터지는 풍선과 비슷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풍선과 달리, 복부 대동맥류는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 한 번 부풀기 시작한 혈관벽은 다시 작아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탄성이 줄어들어 파열 위험도 커진다. 실제로 파열 시 사망률은 80~90%에 달하며, 파열되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 로 불린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심장학회(ACC)와 미국심장협회(AHA)는 복부 대동맥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65세 이상 남성, 흡연 경험자, 가족력 등을 제시하며, 특히 65세 이상 남성 흡연자에게는 최소 1회 이상의 복부 초음파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진단에는 복부 초음파가 가장 널리 사용되며, 보다 정밀한 확인이 필요할 때는 CT 검사가 활용된다. 복부 대동맥의 직경에 따라 추적 검사 주기도 달라진다. 3-3.9cm는 1년마다, 5.5cm는 6개월마다 추적 관찰이 권고된다. 직경이 5.5cm 이상이거나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적극 고려하게 된다.
복부 대동맥류 치료의 진화, EVAR
과거 복부 대동맥류 치료는 복부를 절개해 병든 혈관을 절개하고 인공혈관으로 대체하는 개복 수술이 주를 이뤘다. 1951년, 프랑스의 샤를 루이 뒤보스트(Charles Louis Dubost, 1914~1991)는 세계 최초로 복부 대동맥류 수술에 성공하며, 혈관외과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후 1990년대까지 개복 수술은 유일한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지만, 출혈과 감염, 고위험 마취 등으로 인해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990년대에 도입된 치료법이 바로 EVAR(EndoVascular Aneurysm Repair)이다. EVAR는 복부를 절개하지 않고 혈관 내부에 인공혈관 스텐트(Stent-Graft)를 삽입해 치료하는 ‘최소 침습 혈관 내 시술’이다. 카테터에 접은 상태로 삽입된 인공혈관 스텐트를 대퇴동맥을 통해 병변 부위까지 유도한 후, 그 자리에서 펼쳐 새로운 혈류 통로를 만들고 건강한 혈관벽에 고정한다. 이렇게 되면 부풀어 있던 병든 혈관은 더 이상 압력을 받지 않아 파열 위험이 줄어든다.
EVAR는 개복 수술에 비해 수술 중 사망률과 합병증이 낮고, 30일 이내 단기 사망률도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낮다. 장기 생존율도 개복 수술과 유사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루 갖춘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초기에는 인공혈관 스텐트를 고정할 건강한 혈관벽이 필수였고, 제품 대부분이 서구 체형에 맞춰져 있어 동양인에게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조건의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해졌다. 단, 약 20%의 환자에서는 추후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 일종의 ‘A/S’ 개념이다. 따라서 EVAR 시행 여부는 환자의 전신 상태와 대동맥류의 형태에 따라 신중히 결정된다.
복잡하게 얽힌 혈관 속 위험을 피해 정밀하게 스텐트를 배치하는 EVAR 시술은, 마치 영화 속 폭탄 처리반이 복잡한 전선 중 하나를 골라내는 것처럼 정교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체내의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의료진의 손끝은 그 자체로 경이롭다.
서울대학교병원의 EVAR 시술
복부 대동맥류는 단순히 한 부위의 혈관 문제가 아닌, 고령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된 질환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은 EVAR 시술 시 단일 진료과가 아닌, 혈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순환기내과, 중환자의학과 등 다학제 협진 체계를 중심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평가한다.
특히 심폐 기능 저하,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을 동반한 고령 환자에게는 수술 전 위험도 분석부터 시술 중 긴급 대응, 시술 후 회복 경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의료 설계가 중요하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위험 환자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풍부한 시술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혈관 구조나 재수술 환자에게도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작은 절개, 큰 안정’을 실현하는 EVAR 시술은 단순한 시술 기술을 넘어, 병원 시스템 전체의 역량을 요구하는 정밀한 작업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다학제 협진을 통해 환자의 삶을 진심으로 돌보는 EVAR 치료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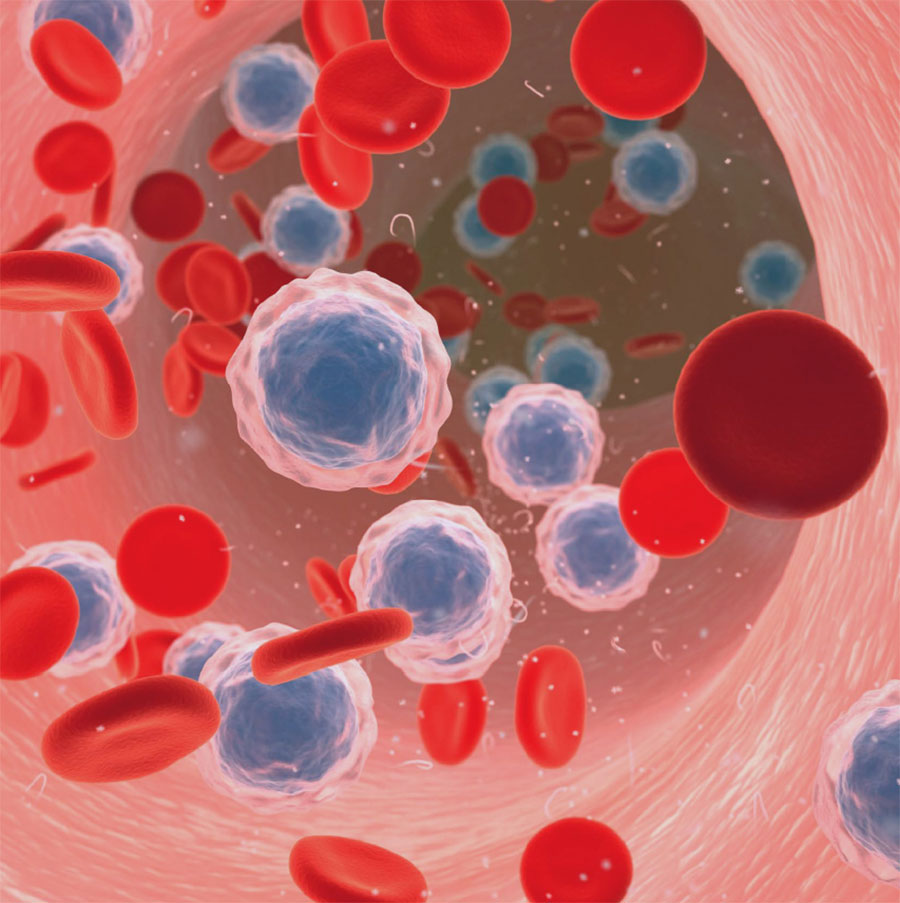
고령사회와 복부 대동맥류
아인슈타인은 1955년, 76세의 나이로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생을 마감했다. 만약 그가 오늘날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루정도의 시술을 받고 퇴원해 다시 연구실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신문 1면에는 ‘아인슈타인을 살린 EVAR, AAA 시한폭탄을 멈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을 것이다. 이 한 줄의 제목은 복부 대동맥류 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많은 고령 환자들이 조용히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복부 대동맥류는 65세 이후 급격히 발병률이 증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약 4,000명이던 국내 환자 수는 2023년에는 약 15,000명에 달할 만큼 빠르게 증가했다. 이 중 60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복부 대동맥류는 고령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건강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다행히 EVAR가 고령 환자에게 특히 적합한 치료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201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에서 EVAR이 개복 수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는 결과도 나왔다. 즉, EVAR은 고령 환자들이 큰 부담 없이 체내 시한폭탄을 제거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 셈이다. 
살덩이_FUNKY SCIENCE,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서강대학교에서 분자면역학,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Science communication and public engagement를 전공했다. 직접 그린 캐릭터로 생명과학 기반의 여러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원리를 ‘할아버지’ ‘할머니’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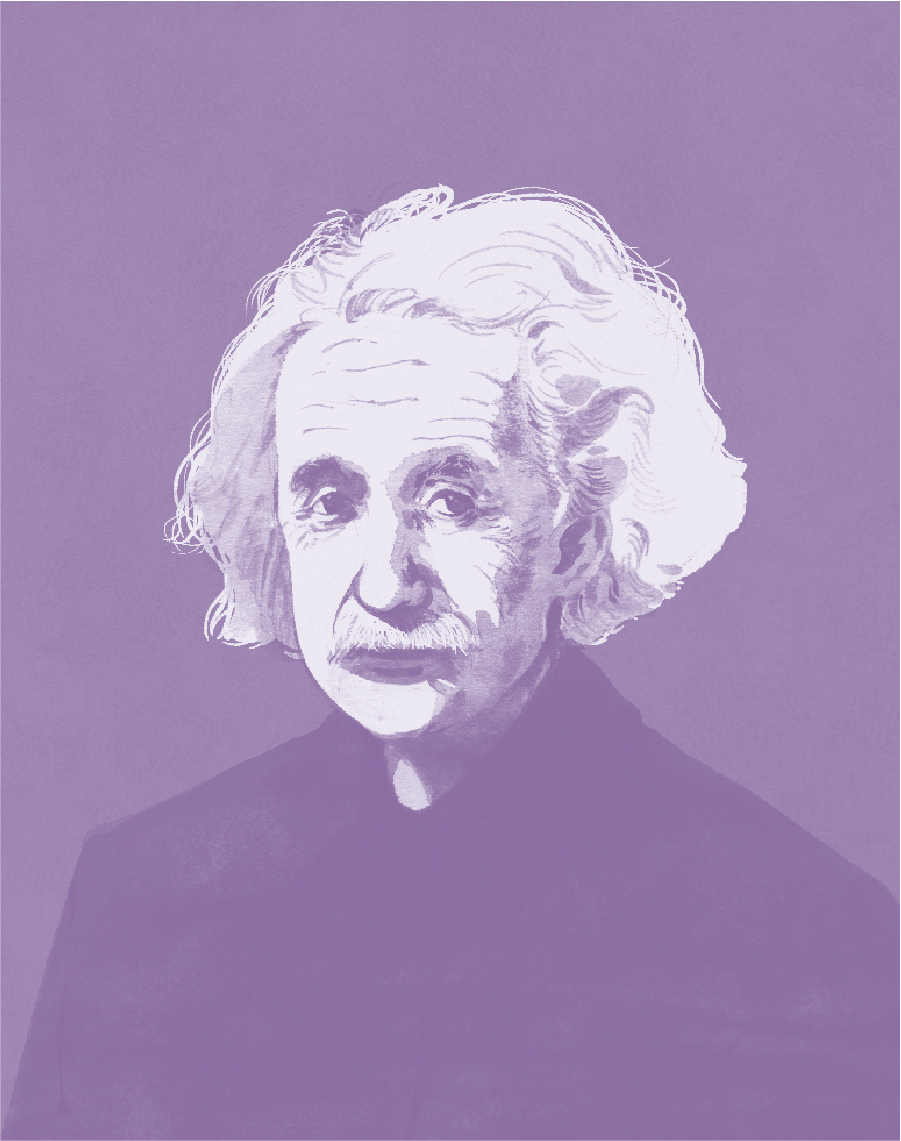 알버트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